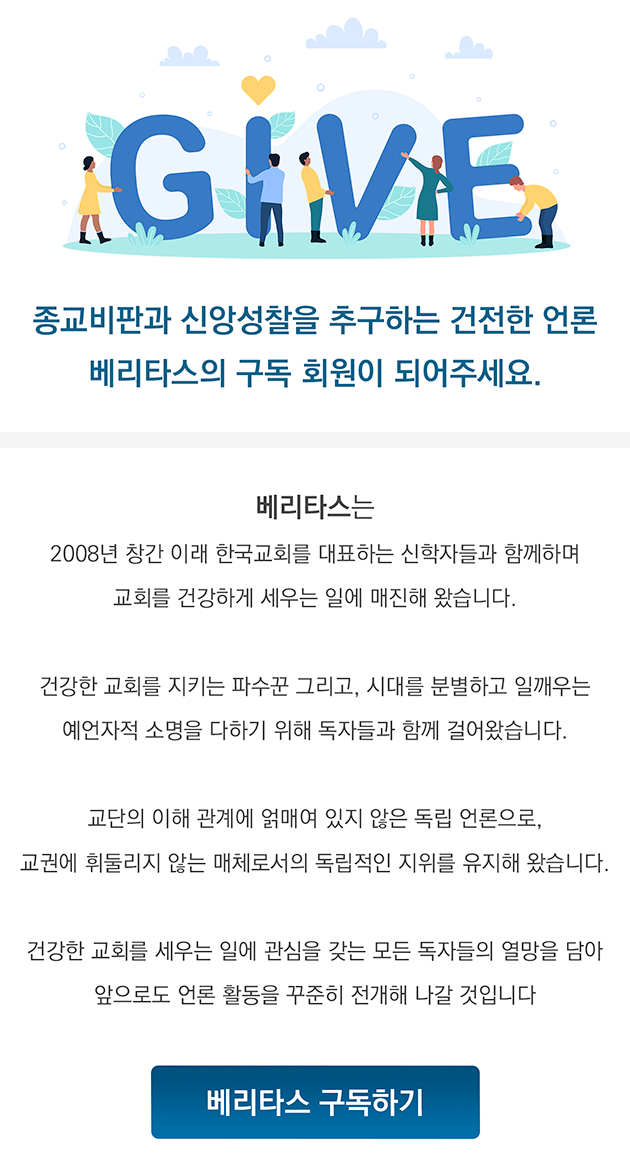1. 열면서
‘하느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늘 새로운 전율을 느끼게 한다. 내가 믿는 하느님과 저이들이 고백하는 하느님이 같은 하느님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내가 따르고자 애쓰는 예수의 삶과 저이들이 영접하라고 외치는 예수의 모습이 생경하게 다가올 때, 내게 끊임없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성령의 기운과 저이들이 받으라고 외치는 성령이 서로 상극관계라고 여겨질 때, 나는 묻고 또 묻는다. ‘하느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지금-여기에 있는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느님을 풀어놓으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 하느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 10대에 만난 하느님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 당신은 고약한 분 같아요!”
“쫀쫀한 하느님!”
- 20대에 만난 하느님
“안개가 자욱한 곳을 헤쳐 가며 만난 하느님”
3. 하느님, 당신은 교리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시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발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인 고백으로 이어지는 목회의 현장까지 이야기로 풀어내려다 보니, 지난 날 내가 애타게 매달렸던 하느님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몇 해 전, 점잖은 목소리의 60대 초반 남성으로 여겨지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 믿는 하느님을 ‘이리저리’ 탐색하더니만, 결국 나를 향해 ‘안수는 제대로 받긴 받은 거요?’하며 왈칵 화를 내던 것이 떠오른다. 내게 영화를 만들 기회가 생긴다면, 으르렁 거리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바람에 어이없어 하던 내 표정을 담아 클로우즈 업 하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신조와 교리의 내용들을 긁어내려 오듯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3-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사도신조) /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 ‘성서가 증언하고 그리스도 교회가 계속 믿어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신을 먼저 계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고백)
3-2.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지혜와 그에게 응답하는 인격을 주셨다. 모든 창조물과 함께 인간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를 즐기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게 하셨다.~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고백서)
4. 지금-여기를 사는 나의 하느님 고백과 목회 현장
4-1.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4-2. 여성 하느님.
4-3. 퀴어 하느님.
5. 나가면서
올해 예수 목회 세미나의 초대의 글 중, 가슴 깊이 와 닿았던 부분은 다양한 차별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의 교회집단’을 지목한 대목이다. 그것도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말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직간접 살인을 대놓고 하는 집단은 우리와는 정녕 전혀 상관없는 집단인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아예 한발 담그고 있을런지도?
무엇으로 보수/진보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지만, 그야말로 보수/진보로 나눈다는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도드라지는 지점이 ‘여성’, ‘성 소수자’문제 이다. 내 자신이 깊게 관여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 ‘민감성’이 발동되는 탓도 있겠지만, 입으로는 ‘성 평등’, ‘동성애자 인권’을 말하지만, 이것이 미처 체득되지 못했을 때의 현상을 주변에서 곧잘 만나게 된다. 마치 이 시대의 트랜드이니 이 정도는 따라 잡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발상에서 출발하다 보니,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쌈닭’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아한 연대감’으로 그 상황을 넘겨야 하는지 헷갈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