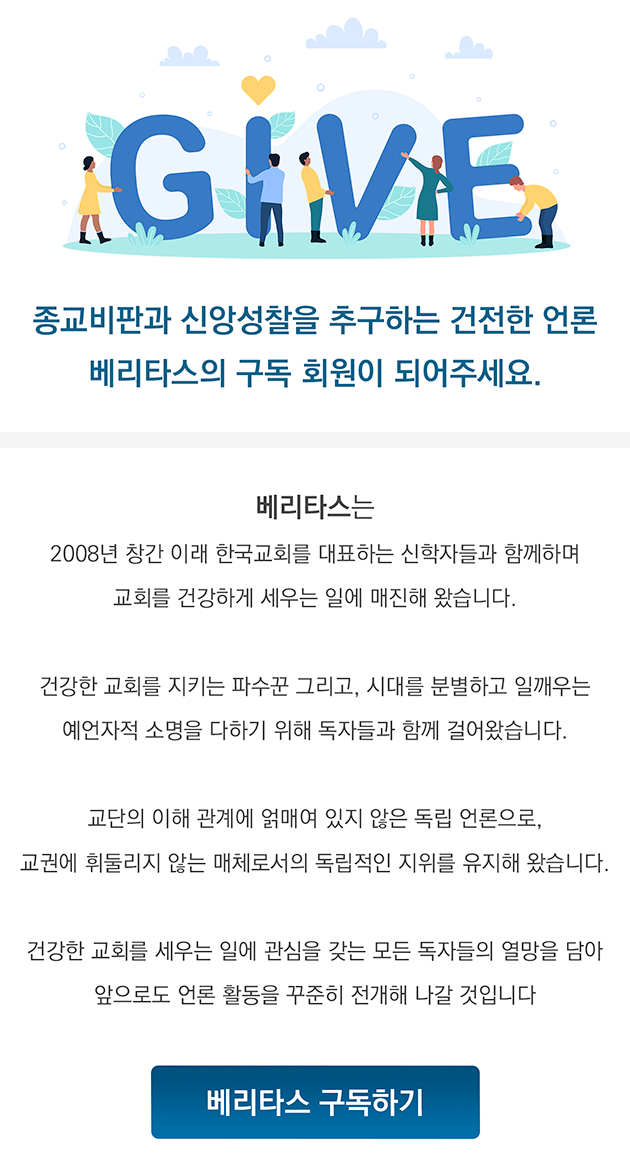출처 : 차정식의 신약성서여행 <바로가기 클릭>
9살의 막내는 대체로 무표정하다. 아빠가 불러도 뚱한 표정으로 반응이 굼뜨다. 음식을 잘 먹지 않아 빼빼 마른 그의 몸뚱이는 우울한 표정과 잘 어울려 어린애답지 않은 데카당스의 분위기를 풍긴다. 가끔 엉뚱한 행동으로 아빠를 당혹케 하는 막내는 제 형들과 비교해도 특이한 기질을 가진 듯하다. 완벽주의 기질에 결벽증까지 있어 내내 아빠를 애먹일 때면 이 작은 생명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의아해지기도 한다. 시험 점수로 100점을 받지 못할 때, 성경퀴즈를 내서 정답을 대지 못할 때, 제 기대에 맞추어 숙제를 완결하지 못할 때, 그는 공책을 연필로 박박 긋거나 세상이 푹 꺼질 듯한 비통한 표정을 짓거나 자정이 가까이 오도록 책상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 일쑤다.
한 번은 막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었다. 자전거를 한 구석에 받쳐놓더니 막내는 놀이터의 빈 운동장을 따라 길게 원을 그리며 죽어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 돌발적인 행동에 나는 뜨악한 표정으로 그 아이의 몸짓을 꽤 정밀하게 관찰해보았다. 무엇이 이 느린 녀석의 발에 저리 잽싼 엔진을 달게 만들었을까. 뱅글뱅글 몇 바퀴 돌았을까. 숨을 고르는 막내에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달린 것이냐고. 막내답게 대답으로 돌아온 말은 ‘그냥’이란 그저 그런 심심하고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나는 버릇처럼 속으로 그 상황을 오래 곱씹으며 상상해보았다. 무어 그리 무거운 생의 짐을 졌기에 저 아이는 그렇게 날듯이 달리고 싶었을까. 등허리의 책가방이, 선생의 억압적인 훈시가, 조직 내에서 벌써부터 경쟁해야 하는 그 초조한 심리가, 때로 부모의 호령과 회초리가 이 아이의 마음에 돋은 날개를 꺾어버린 것일까. 그래서 날개를 살리려 그렇게 쌩쌩거리며 바람을 만들었던 것일까.
또 한 번은 자전거 대신 함께 보행의 길에 나섰다. 아중천변에 깔아놓은 보도 위로 한참을 걷다가 돌이켜야 할 지점에서 징검다리를 건넜다. 막내는 징검다리에서 잠시 멈추었고 내가 제지할 틈도 없이 주저앉더니 그 물을 손으로 훔쳐 제 얼굴의 땀을 닦는 것이 아닌가. 추운 겨울날씨였고, 흐르는 물은 아중지에서 고였다가 복개된 수렁을 타고 내려온 오염된 물이었다. 오래 지속된 겨울가뭄 등쌀에 유속이 별로 없는 더러운 물이었다. 아뿔싸, 속으로 탄식을 죽이며 나는 그때 잠깐 제지하는 한두 마디 내뱉고 이내 잠잠했다. 막내의 개성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막내의 행동은 이렇듯 즉흥적이었고 거침없었다. 예측불허의 제 욕동에 천연덕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목욕탕에 샤워기 받침대를 비틀어 망가트린 것도 제 나름의 호기심이 작용했겠지만 전혀 거리낌 없는 질주의 연장이었다. 아빠와 단 둘이 축구를 할 때는 지지 않기 위해 집요하였고 거의 필사적으로 대들었다. 말라깽이 몸으로 제 아빠의 발을 차면서 반칙을 했다. 제 쪽으로 골이 들어가면 기를 쓰고 우기면서 그 골에 나름의 사유를 붙여 무효로 만들었고, 내 쪽으로 골이 먹히면 자신의 반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별의별 원칙과 기억을 들이대며 그것이 왜 정당한지 변증하려는 기세가 등등했다.
막내의 몸이 담고 표현하려는 욕망은 예의 집요한 승부근성과 뜬금없는 탈주의 축을 오락가락하는 듯 보인다. 축구하거나 숙제할 때는 전자가 발동하고 갑자기 운동장을 바람처럼 달리며 빙빙 돌 때는 후자가 기승을 부린다. 그 균열을 버티기 어려운지 그는 구정물 하수도 물로 얼굴에 바르며 땀을 닦아내는 일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행한다. 막내의 이런 행동이 기이하게 느껴지는 나는 이미 충분히 사회화되어 규범의 잣대로 기어코 녀석의 기질과 욕망을 분석하고야 만다. 반면 그는 그러한 틀 밖에서 제 나름대로 몰두하거니 벗어나거니 하면서 우울한 듯 유쾌해 보인다.
이 막내의 이름은 가람이다. 강처럼 유유히 흐르듯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다. 아직 유장한 강의 흐름을 만들고 있지 못하지만 쫑알거리며 흐르는 계류의 가벼운 촐랑거림이 그의 몸짓과 행태에 숨어 있다. 그는 그 계류가 지겨운지 때로 그 흐름을 틀짓는 물의 경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래서 아빠의 지청구에 모른 척 한 눈 팔면서, 열 번 불러야 겨우 한 번 흘깃 시선을 준다. 그런 그의 덤덤함이 혹 하나님의 초연한 침묵에 유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과장이라면 자연의 묵묵한 무위적 포즈를 조금 닮은 건 아닐까 하는 하릴없는 잡념이 생기기도 한다.
그 막내가 오늘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놀이터 운동장에서의 질주도 멈추고 개울물 앞에서 탈주하지도 못한 채 며칠째 몸을 사리고 있다. 독감이 들어 열이 나더니 오늘은 구토까지 하며 그 빼빼마른 몸을 들썩이고 있다. 나는 그 작은 생명을 내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인다. 가엾은 녀석! 어려서부터 많은 짐을 지게 만들어 미안하구나. 다시 회복하여 그 기운찬 발로 아빠의 조인트를 까더라도 그렇게 다시 다부지게 덤벼보려무나. 등허리에 이 봄바람이 선사하는 싱그러운 새싹 날개를 달고 비상하여 네 자유의 무늬를 맘껏 수놓아보려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