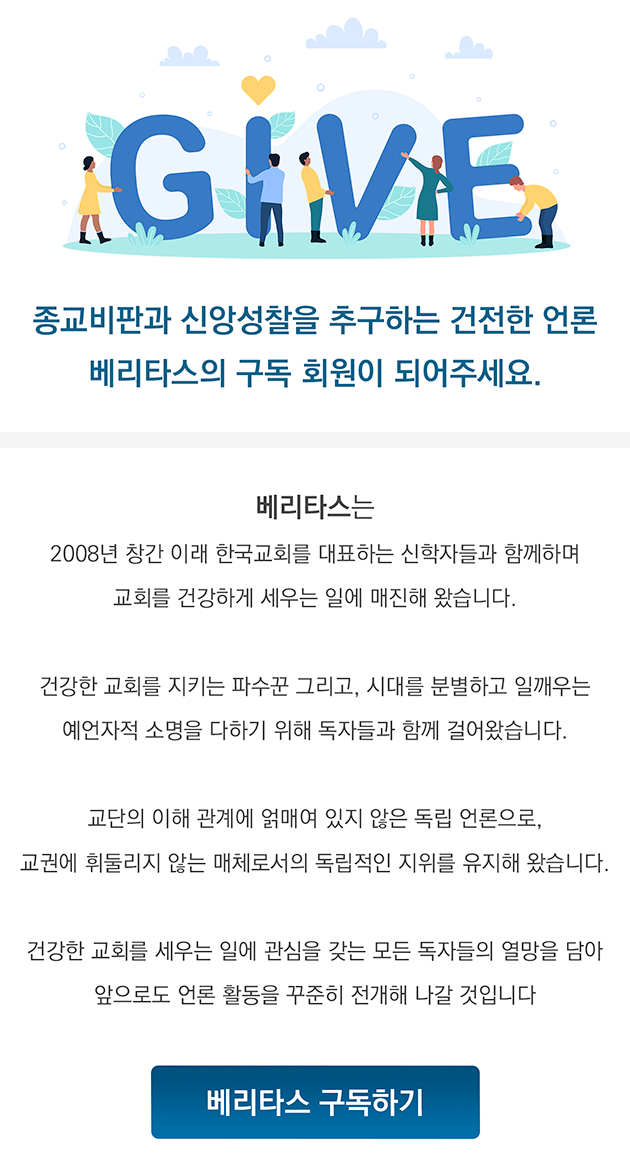아파트 잔디밭 바위 위에 잠자리 한 마리 앉아 햇볕을 쬐고 있다. 간밤의 어둔 기억을 털어내며, 아침이슬을 말리고 있다. 평온하다. 조는 듯, 명상하는 듯, 그 잠자리 한 마리의 포즈에 내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생각 없이 가벼운 날개 위에 햇볕을 받는 순간은 얼마나 행복한가. 바위는 아침햇살 아래 충분히 달구어져 있다. 그의 가느다란 다리도 발바닥에 달라붙은 섬세한 솜털도 그 따스한 온기에 깊이 머무는 듯, 미동이 없다. 모시망사보다 더 얇고 섬세한 날개는 양 옆으로 퍼져 이슬에 젖은 축축한 내면을 휘발시키고 있다. 고요하다. 이 다사로운 아침 풍경은 왜 그리도 경건하게 내 시선을 떨리게 하는가. 이 시월 한복판의 아침햇살은 왜 그리도 서럽게 고맙고 정겨운 것인가.
돌이켜보면 햇볕의 기억은 계절마다 다르게 내 감각을 자극했다. 봄날의 햇볕은 웅크렸던 겨울철의 쌀쌀함에 대한 간절한 보상으로 찾아오기 일쑤였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사위로 좌충우돌 먹잇감을 찾듯 햇볕은 일용할 양식으로 쟁취해야 할 대상 같았다. 동네 초가의 처마 밑에 고드름 녹은 물이 떨어질 즈음, 소년은 그 빛에 환한 햇살이 그 물방울에 부서지는 장면을 쳐다보며 물끄러미 쪼그려앉곤 하였다. 질척거리는 주변의 땅바닥을 피해 간신히 마른 땅 한 구석을 찾으면 영락없이 햇살이 모여들었다. 칙칙한 몰골이 호사를 누리는 짧은 순간이었다. 우울한 기억과 적빈의 휑한 가슴이 부요해지는 은총의 모서리였다. 딱딱한 고드름이 부드럽게 풀어져 지푸라기 냄새를 싣고 내릴라치면 햇살은 그 아롱지는 물방울을 보듬으며 앞으로 디뎌나가야 할 지상의 여정을 안내했다. 내 시선은 그 포획된 풍경 아래 소박하게 행복했을 터이다.
여름의 쨍쨍거리는 더운 볕뉘는 차라리 망각의 대상이었다. 땀에 절은 내 몸은 전전긍긍하며 그늘을 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풀 속에, 시냇물 아래, 심지어 동굴 속으로 숨어 햇볕은 이별해야 할 애증의 연인 같았다. 그렇게 작별의 망각이 길어질 때면 대낮의 햇살은 그 대신 들판의 곡식들을 향해 무구한 성장의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었다. 무성하게 자라는 그 초록의 들판과 풍요한 산하의 물상들에게 햇볕은 보너스처럼 보름달처럼 늘 여분의 생명을 부여했다. 더울수록 더 바지런한 노동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찌우는 신진대사는 그 여분에 대한 감격의 답례였을 것이다.
가을이 들판을 익게 만들 때부터 햇볕은 아침과 저녁 나절 아쉬운 그대의 추억처럼 몸을 불러냈다. 황혼이 왜 황홀할 수밖에 없는지, 아침햇살이 왜 이별 너머 재회의 신호인지 관념의 추상에 앞서 몸의 구체가 그 전갈을 받아 먼저 알아챘다. 낙엽이 다 내리기 전, 또 다시 고드름의 계절로 잠입하기 전, 햇살은 몸을 알맞게 달구고 나서 사념마저 익게 만들곤 했다. 괜스레 더 긴 걸음으로 멀리 걷다보면 햇볕과 몸은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 우주의 저편으로 날아갈 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일과를 망각에 묻고 언어를 잃어버려도 햇볕 한 가닥만으로도 하루의 여행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또 그 계절의 바퀴 한 바탕 돌아 다시 그 햇볕의 은총을 끌고 내 공허한 등판에 머문다. 고추잠자리 두 날개에도 머물며 고졸한 이미지 한 컷 선사한다. 조용히 속삭이며 전한다. 너의 ‘쇠도끼’는 ‘나뭇가지’로 띄워 찾아낼 수 있다고. 몸을 가볍게 하듯 정신을 줄이고 이제 보송보송한 날갯짓으로 저 햇살을 쫓아 무상한 여행을 떠나보라고 말이다. 잠자리는 내 손바닥 그늘에 당황했을까. 날개를 쫑긋거리며, 장난은 순전히 장난으로 화답된다. 아, 아직 따스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그 사실을 되뇌며 걷는 대지가 다시 정겨워진다. 내 등짝의 메마른 고독을 달구는 햇볕의 동선은 오래 묵은 자유의 한량이다. 그 헛헛한 소요의 틈새이다. 더 유쾌하게 놀고 싶은 에누리의 생명이다. 오로지 그 틈새와 에누리의 힘으로 계시의 순정을 회복시키는 저 둥근 햇볕의 다독임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