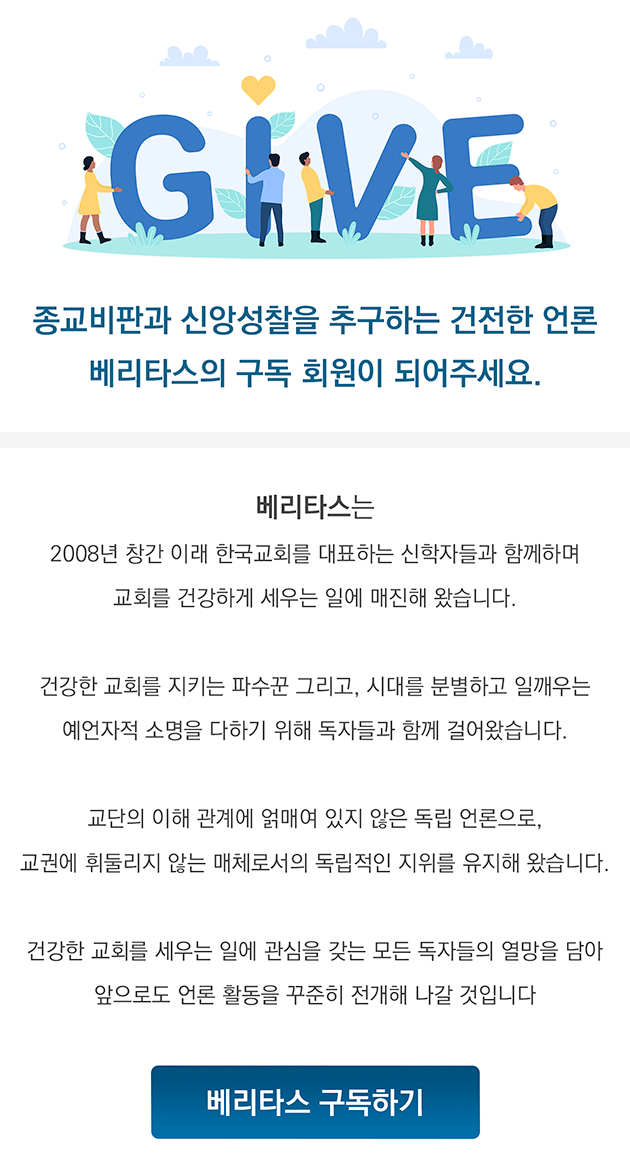제목 / 신학함의 자리를 생각하며 제네바의 구시가지 남쪽에 저명한 인물들의 공동묘지(Cimetiere des Rois)가 있다. 그곳에는 칼빈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묘(707호)가 있다. 원래 칼빈의 장례는 그 자신의 뜻에 따라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묘비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평범한 묘 앞에는 그의 이름 아래로 서너 줄의 설명을 덧붙인 작은 동판이 놓여있을 뿐이다. 칼빈의 묘 앞에 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해 본다. 파렐에게 이끌려 제네바에 왔지만, 그를 환영한 것은 그를 위협하기 위해 저녁마다 집 밖에서 쏘아대는 요란한 총소리였다. 반대자들의 저항에 견디다 못해 추방당한 칼빈은 스트라스보로로 갔다. 3년 뒤 제네바로 다시 돌아왔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반대파들은 그의 뒤로 개를 풀어 놓아 옷을 찢고 다리를 물게 하기도 했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야 했기에 그랬는지, 칼빈은 『기독교강요』가 완성되고, 제네바 대학교가 세워진 1559년까지도 제네바 시민권을 받지 않았다. 칼빈은 단 하루도 편히 시간을 내어 신학논문을 집필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직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기독교강요』도 단박에 써진 것이 아니었다. 스트라스보로에서 완성한 초본부터 최종 본에 이르기까지 스무 해가 훨씬 넘는 세월이 걸렸다. 옷으로 하면 누더기를 기우고 기워 틀과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본래 옷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칼빈은 끊임없이 글을 써야만 했다. 잠 잘 시간이 모자라서 거의 실신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요청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편지가 사천 통이 넘는다. 그래서 그는 동료에게 종종 글쓰기를 혐오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가 제네바에서 행한 설교도 사천편이 넘는다. 한 주에 세 편 이상의 설교를 한 것이다. 게다가 주 중, 아침 여섯시에는 구약성서 강해를, 주일 아침에는 신약성서 강해를,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시편 강해를 했다. 제네바 종교개혁 박물관에 걸려있는 조제프 어눙(Joseph Hornung)의 유화 「칼빈의 작별인사 (Les adieux de Calvin)」에 그려진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누더기 같이 초췌하기만 하다. 말년의 칼빈은 일종의 종합병동 환자였다. 젊은 학창시절에 지나친 공부로 인해서 건강을 해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스스로 진단하여 의사들에게 적어 보낸 증상 목록을 보면, 관절염, 장출혈, 치질에 신장 결석까지, 가히 모든 질병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성 신경질환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려야했는데, 특히 한 밤중이면 찾아오는 심한 두통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질병을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죽음의 메시지’로 이해했다. 제네바의 칼빈은 원주민들의 텃세에 시달리며, 이주자의 설움을 가슴에 삭히며 살아야 했던 목회자였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는 불의와 부당함에 타협하기보다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 피가 너희에게 항의할 것이라.’고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교회를 돌보며,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다. 칼빈은 그렇게 생명의 불꽃을 남김없이 사르며 쉰다섯 해를 살았다. 칼빈의 묘 앞에 서서 희미하게 그려보는 칼빈의 이미지 위로 오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큰 교회를 이룬 한 목회자가 병들어 누어있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후배 목사를 불러 ‘쉬어가며 일하라.’는 부탁을 남겼다는 말씀이 떠오른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겪어야 하는 운명은 별반 차이가 없나보다. 칼빈에게 목회 현장은 끊임없는 갈등의 현장이었지만, 그는 그곳을 신학함의 자리로 삼았다. 그의 일차적 관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데 놓여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성서를 해석하고, 기꺼이 펜을 들었다. 그런데 칼빈의 글을 단지 신학 작품으로 바라보려는 데서부터 엇갈림은 시작된다. 칼빈‘주의자’들이 등장하고, 냉혹한 비판론자들이 나타난다. 목회 현장으로부터 일탈한 신학은 긴장감 넘치는 생명력을 이어가지 못한다. 아카데미아의 전유물이 되거나, 교리적 변증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내포한 시류적 선언에 머물게 되고 만다. 이렇게 신학이 병들면 목회가 병든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학사조를 일으키려는 운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새로운 교회 질서를 세우려는 운동이었다.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성 삐에르 교회당에는 지금도 ‘칼빈의 의자’가 놓여있다. 취리히의 바써 교회 앞에는 쯔빙글리의 상이 서있고, 대교회당 입구 벽에는 불링거의 상이 서있다. 바젤의 대교회당 입구 벽에는 외콜람파드의 상이 서있다. 그들 모두 말없이 종교개혁자들의 선 자리가 교회였음을 증거하고 있다. 병상의 칼빈은 그를 보러 먼 길을 달려온 파렐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한다. 파렐은 칼빈보다 이십년 연배가 되지만 칼빈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긴 파렐은 제네바 교회의 조직적 체계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 칼빈을 불러들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한 때 머물며 신학을 가르쳤던 작은 도시 뉘샤텔로 떠나갔다.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탈출한 이주민 공동체의 목회자가 되어 종교개혁을 전파했다. 파렐이 목회한 위그노 공동체에는 시계 장인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스위스의 시계 제작 전통이 시작되었다. 오늘도 뉘샤텔 시민들은 파렐의 상을 세워 그를 기억하고 있다. 칼빈의 묘 앞에 서서 목회자 칼빈을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 파렐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글 / 이재천(기장신학연구소 소장)
출처 / 기장신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