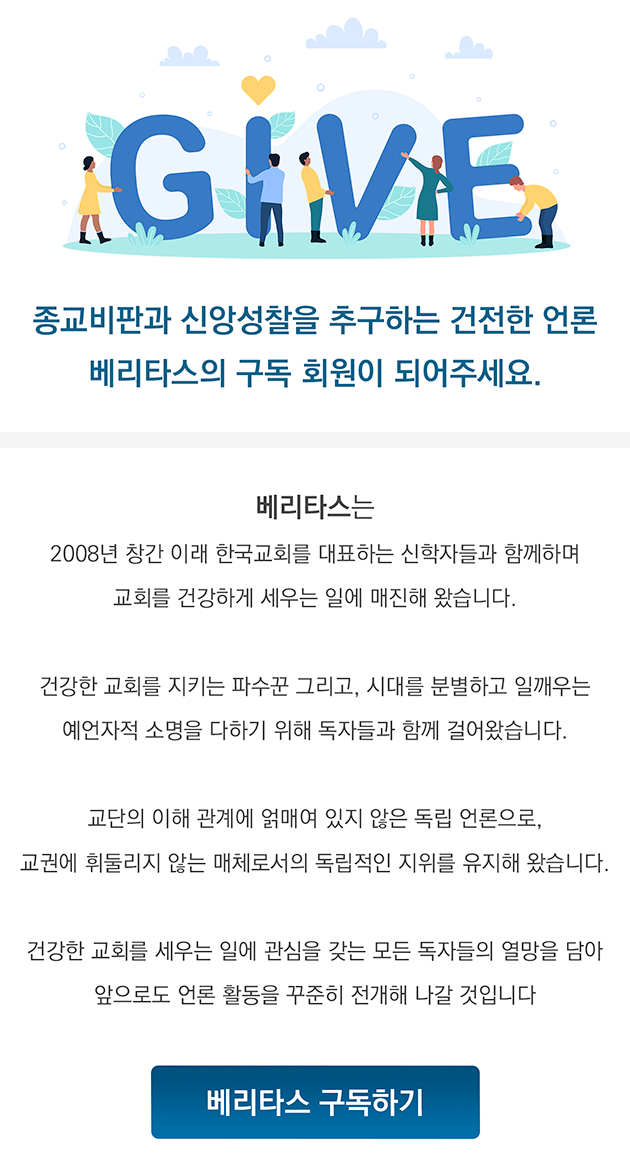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
|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
야간 산책 하다가 동행이 물었다. 요즘 초딩 중고딩 대딩 할 것 없이 학생들 손글씨가 왜들 그리도 한 통속으로 엉망진창이냐고. 영상 세대에 속한 아이들인데 몸으로 익힌 감각의 결핍과 과잉이 어디 가겠냐고 내가 답했다.
작가 김훈이 글쓰기 도구의 진화에 합류하길 거부하고 여전히 몽당연필로 글을 쓴단 얘긴 많이 알려진 바다. 소시적에 익숙한 걸 줄곧 고집하는 건 늙은 기성세대의 특기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30년 이민목회 하시다 은퇴한 뒤 1년 전 영구 귀국하신 황 목사님은 평화동 노인복지관에서 1000원짜리 점심을 드시고 신문잡지 등의 읽을거리 뒤적이며 온종일 보내신다.
플로리다 이민교회에서 만난 한글 책자란 게 몇 십년 뒤처진 구닥다리들이었으니 업데이트된 종이 신문잡지 들고 한가한 소일거리 삼는 게 얼마나 갈구되었으랴 싶다. 그 포즈가 황 목사님이 국내에서 잠시 공무원으로 살던 20대 청춘의 기억으로 아마 가장 회복하고 싶었던 과거의 일부였겠거니 한다.
나 역시 외국어 책을 의무적으로 끼고 살아야 하던 때 툭하면 도서관 5층의 동양학 섹션에 가서 한국에서 오는 각종 정기간행물과 문학도서를 친애했으니 디아스포라 거주자의 모국어에 대한 갈증은 보편적인 현상인 듯하다.
그래도, 글쓰기의 도구에 관한 한, 나와 내 세대는 꾸준히 진화하면서 정신없이 적응해온 것만은 틀림없다. 초등학교 때는 몽당연필에 침 발라 쓰다가 6학년 때 샤프연필을 손에 쥐고 얼마나 신기해했는지 모른다. 중학교 때 모나미 볼펜을 손등 위에 돌리던 기억이 생생하고 고등학교 졸업선물로 좀 고급스런 파커 볼펜을 받아 애지중지한 기억이 난다.
그 뒤로 대학교 때 잉크 카트리지 갈아 끼는 간편한 만년필을 사용하여 주로 기말보고서를 쓰다가 미국에 건너가 신학대학원 시절엔 세탁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난생처음 타이프라이터를 만질 수 있었다. 그걸로 각종 제출용 페이퍼 쓰던 기간이 2년 남짓, 졸업용 석사논문은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구입하게 된 엡슨 컴퓨터로 해결했다. 이것이 그때 당시 등장한 신식 글쓰기 도구였다.
그걸로는 글을 쓴다기보다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았다. 이후 90년대 중반 나는 애플 매킨토쉬 초기 사양을 3천 달러 거금을 주고 구입하여 박사논문을 썼다.
국내로 귀국하여 십수 년간 삼성과 삼보 상표가 찍힌 데스크탑 피씨에 두세 번 갈아치운 노트북 컴퓨터가 내 책상에 늘 있었고, 요즘엔 역시 두세 번 업그레이드한 스맛폰으로 양손을 놀려 이런 잡문을 자주 쓰는 편이다.
몽당연필에서 갤럭시 스맛폰까지 참 눈부신 진화의 여정 아닌가. 아날로그에서 다지털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전근대와 근현대, 포스트모던을 손가락의 감각에 담아온 우리는 천상 잡탕 세대가 아닌가 싶다.
그렇게 종횡무진 질주하는 홍길동의 동선으로 유목하듯 오늘은 서울 염곡동에 가서 1억 7천만원짜리 연구비 심사처리하고 내일은 충북 옥천의 요엘 수목원에 가서 노지용 체리나무, 대추나무, 단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등을 사다 심으려 한다.
이렇게 에덴의 채집경제에서 첨단 디지털을 넘나드는 잡탕세대의 일원으로 우리가 김훈 작가나 황 목사님처럼 60을 넘기고 80을 코앞에 둘 때 무엇을 주로 고집하며 손가락의 감각을 희롱하게 될지 괜스레 궁금해진다.
천변 산책길에서 돌아오다 만난 가로등 불빛의 이미지에서 내가 좋아하는 '원융일체'란 말을 떠올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