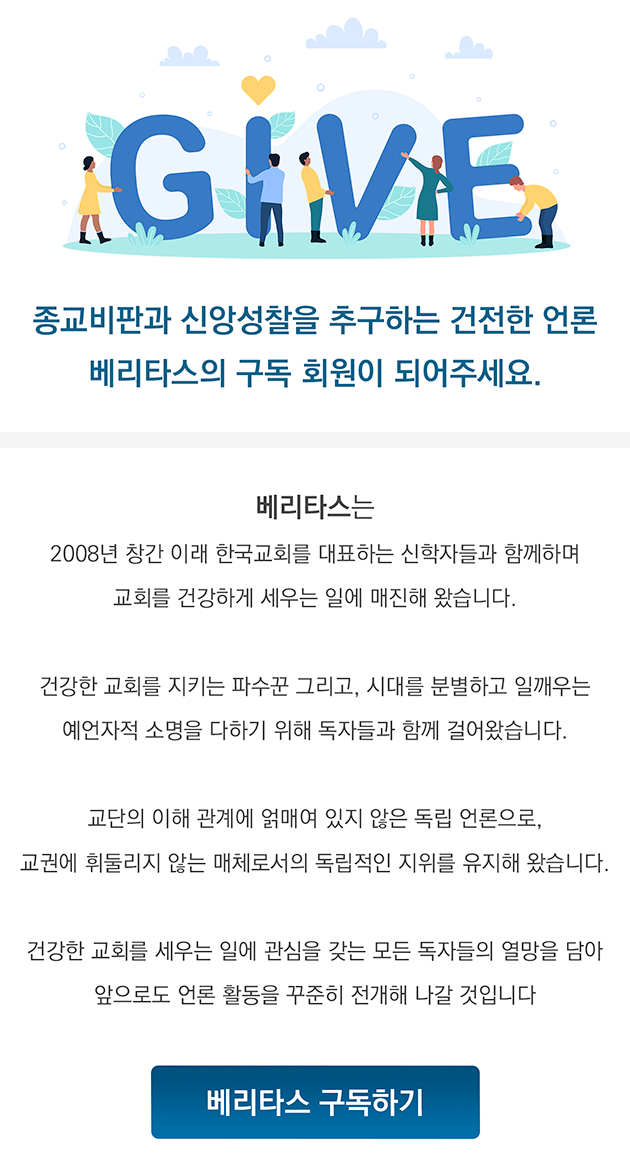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
|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
어제 쓴 페이스북 글을 오늘 고쳐 다듬는다. 토씨를 다듬고 어휘를 교체하며 콤마를 삽입한다.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구멍이 생긴 곳은 메워 넣으며 어색한 곳은 세공을 한다. 문단을 재편집하기도 한다. 댓글도 띄어쓰기가 헝클어진 곳을 다시 수정하고 오타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교정한다. 다른 이들의 것까지 손질하려는 충동이 일순간 생기지만 ‘과유불급’의 분수를 지키기로 한다.
간밤 꿈에서 보거나 느낀 것이 이 모든 수정과 편집 작업에 미세한 영향을 끼치는 걸까. 아니, 오로지 반성의 훈련으로, 말이 그렇듯, 제가 싸질러놓은 글 역시 삶의 민감한 비늘이기에 고치고 또 다듬어 새로 쓰는 것이리라.
지난 6년간 열심히 감당한 편집노동의 후유증이 쓸데없는 결벽증과 강박증을 심어준 것이라고 해도 괜찮다. 왕년에 유학시절 B학점짜리 기말보고서를 A학점으로 올려보려고 제출 직전까지 자그마치 30번 가까이 수정해본 추억의 가시가 돋친 탓이라고 변명해도 좋을 것이다. 혹은 한 치 앞길을 가늠할 수 없는 감정의 변덕과 감각의 요동에 휘둘려 사소한 일에 엉뚱한 에너지를 투여하는 게 아니냐는 지청구를 들어도 상관 없겠다.
날마다 고치고 다듬어야 그나마 사람 꼴을 갖추고 살 수 있는 게 인생인데, 말과 글을 되짚어 고치는 건 그 기본이고, 어쩌면 신학적 의미마저 웅숭깊이 담아내고 있는 듯 여겨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독교신자들이 받들어온 성서는 맨 처음 기록된 이후 수많은 사본 작업을 거쳐 고쳐 쓰기를 되풀이해왔다. 원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모호한 대목을 명확하게 표기하느라 일부러 바꿔 쓰기도 하고 실수로 잘못 고쳐 쓴 부분도 있었다. 어휘와 문구의 뜻을 좀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욕이 수정의 동기를 부추겼고, 추후 장구한 편집본의 역사로 이어져 갔다.
신약성서의 경우를 예로 들면 16세기 초 에라스무스에 의해 희랍어 편집본이 만들어졌고 고대의 사본이 발견되면서 19세기에는 라흐만, 티센도르프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비평적 편집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에라스무스 당시 빈약한 희랍어 사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라틴어 불가타역의 본문을 희랍어로 재번역하여 본문을 생산하는 공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꾸준히 고쳐 쓰고 편집하는 면면한 수작업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 분해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성서에 대한 편집과 수정작업은 오늘날까지 ‘비평’의 공정 속에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마저 그 생존의 뒤안길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유한한 인간의 삶인즉 얼마나 허방이 많겠는가. 그 자체가 미완성이고 불연속의 과정이며 불안정한 실존의 자리이다. 따라서 그것은 오로지 제 삶의 에너지를 기틀로 삼아 날마다 고치고 재구성하는 편집의 작업 속에서야 뒤뚱거리며 굴러갈 수 있는 무엇이다.
제 말을 뒤집어 고쳐나가는 일은 제 생각을 보완하는 길이다. 제 글의 미세한 오류와 어색한 대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하고 다시 편제하는 일은 제 삶의 바탕이 하나님 앞에 미완성임을 겸허히 수긍하면서 그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여정 속에 맞물려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신실한 모방의 한 샛길이다.
이 땅에 대통령과 사장으로부터 일용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말을 창조적으로 바꿀 줄 알고 제 글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것이 제 삶의 한 가운데 보다 아름답게 성육하는 기미에 민감해졌으면 좋겠다. 콤마 하나, 토씨 하나의 수정과 편집에 숨은 삶의 진정성이 어떻게 보편의 바다로 순환하는지 그 섬세한 이치에 눈 떠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말과 문장이 신묘한 담론의 질서를 이루고, 그것이 보다 행복한 일상의 정치와 복지의 문화로 구현될 때, 우리는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지 몰라도 좋을 것이다. 누가 돈 많은 부자이고 누가 유력한 목사이며 누가 감동적인 설교자인지 망각해도 무난할 것이다.
문득 커튼 뒤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린다. 말이 바뀌어도 음흉한 사람들의 그 속내가 바뀔까. 글 몇 조각 수정되고 신선하게 재구성된다고 세상이 좋아질까. 바뀌는 건 좋은데 도리어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타박하는 원성도 자자하다.
타락한 말의 역사, 주인 없이 떠도는 글의 방황 속에서 오죽 실망했으면 비관과 냉소가 오늘날 우리의 체질이 되었을까 싶다. 그래도 미완성과 불연속의 질곡을 뚫고 고쳐 쓰며 새롭게 말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과 앎을 재배치함으로써 우리 삶을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재창조하려는 의욕은 지극히 사소한 구석에서 출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말론적 징후는 우주와 천지만물의 조화를 통과하여 생명의 미세한 기미에서 꼼지락거리는 법!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언어로 호흡해온 이래 수없이 고쳐 말하고 다시 써온 말/글의 겨우살이가 길다. 이제 광야의 거친 기운을 다독이고 우렁찬 광장의 열기를 식히며 다시 제 말을 곰삭혀 고치며 재구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세밀한 골짜기의 상상력을 품고 제 말을 다듬고 제 글을 고쳐보자. 제 탱탱한 앎이 축조한 담론의 체계를 재편집하고, 그렇게 조금씩 반성의 공력 속에 진보해가는 생각의 기미에 눈떠 보자. 그 생각이 마침내 어휘력 빈곤하다는 대통령과 먹고사느라 여념이 없는 무지렁이 대중의 대뇌 속에도 이식되어 꽃을 피운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그 불우한 희망에 기대어 대담한 정치, 하나님 나라의 대변혁으로 나아가는 미세한 물길들을 모아 이 시대의 장벽을 넘어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