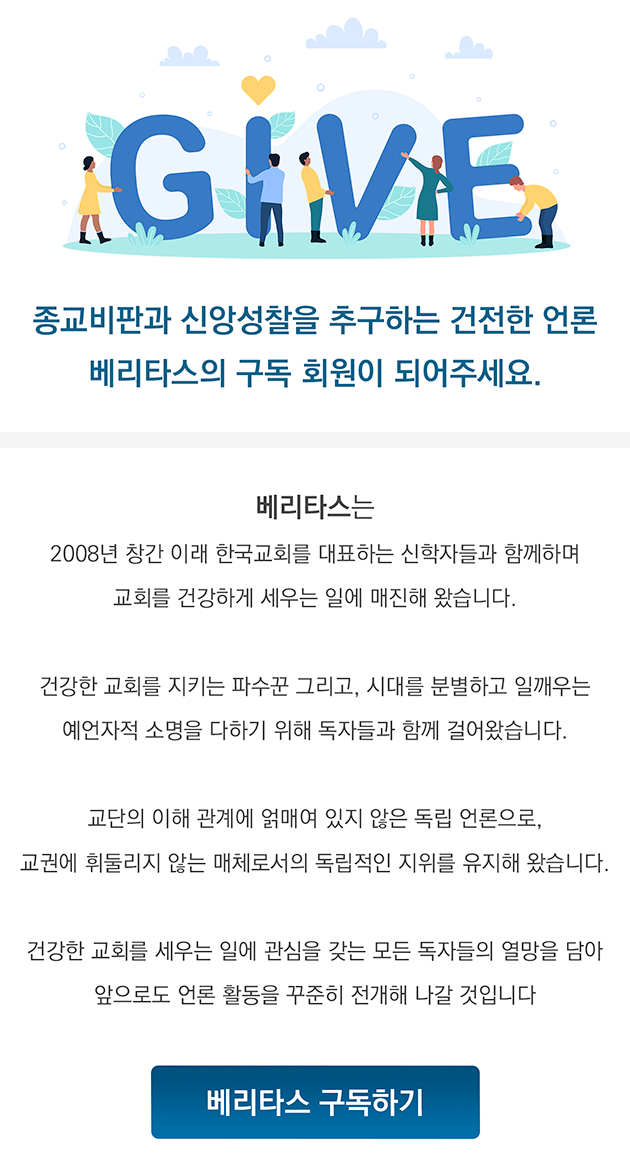출처 : 차정식의 신약성서여행 <바로가기 클릭>
 |
|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
이렇게 나 몰래 생기는 상처들이 더러 있다. 종이에 슬쩍 베이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카로운 곳에 피부가 닿아 슬쩍 생기기도 한다. 모두 나 몰래, 내 의식이 민감하게 가닿지 못하는 감각의 변두리에서 생기는 작은 상처들이다.
변두리에, 그것도 일순간 '슬쩍' 생기는 너무 작은 상처라 몸의 중심부는 그 환부를 외면한다. 그곳으로 물이 스며들고 그 상처의 구멍을 부풀리면서 조금씩 외치기 시작할 때서야 몸의 신경계는 기별을 한다. 무슨 일 있었냐고, 언제 거기를 그렇게 다쳤냐고, 방정맞게 운신하지 말고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마치 남 얘기 하듯, 그렇게 다그치곤 한다.
큰 상처와 달리, 내 의식이 온전히 집중되는 넓은 환부와 달리, 이렇게 작은 상처는 은근하면서도 집요한 아우성으로 제 통증을 전달한다. 그동안 외면당한 설움을 모아 한꺼번에 복수하기라도 하듯 제 환부를 자학적으로 찢어발기면서 아픔을 호소한다.
이렇게 나 몰래 생기는 상처의 증거를 뒤집어 묵상하다 보면 나 몰래 끼치는 상처의 흔적들이 막연하게 떠오른다. 나도 몰래, 내 미세한 말과 글과 행동이, 내 소소한 제스처와 시선들이, 내 동선과 표정들이 나 모르는 사이에, 나 모르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심장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켜,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눌렸는지도 모른 채 불특정 개인과 집단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가.
그래서 그 상처의 기억들로 남 몰래, 나 몰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적은 없었는가. 모든 크고작은 상처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종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성냥불 당겨지듯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 확 번져오는 속성을 갖고 태어난다.
나 몰래 생기는 상처의 한 구석이 그 감추어진 사연을 증언하는 아침, 어쩌면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