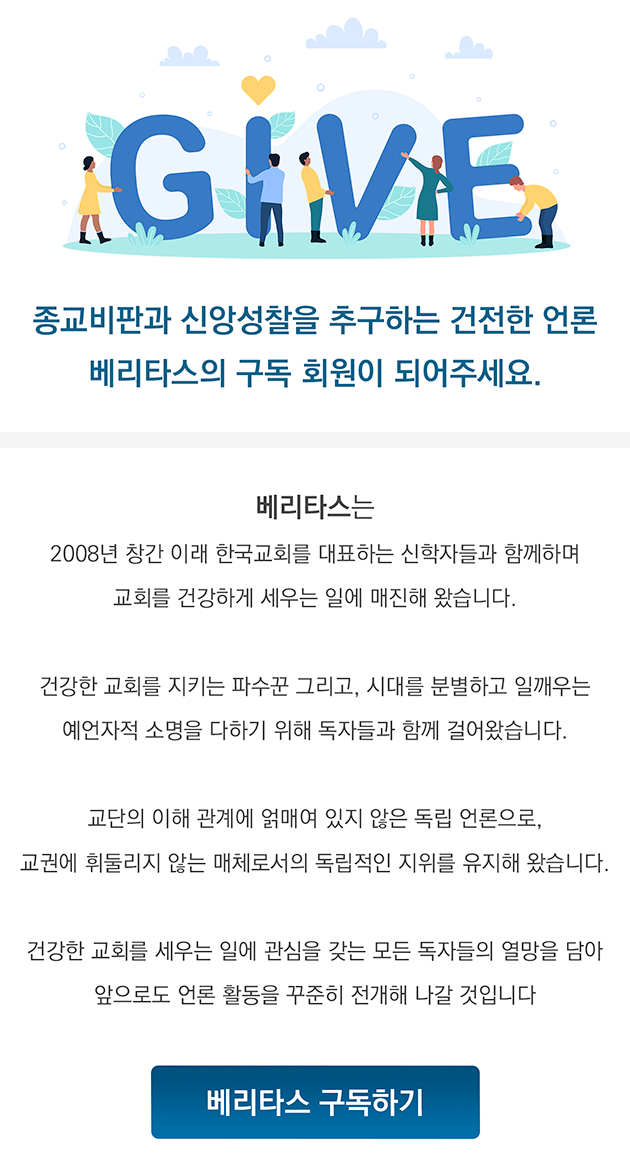출처 : 차정식의 신약성서여행 <바로가기 클릭>
 |
|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
그는 요한복음 4장의 본문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를 주제 삼아 설교했다. 가지런히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는 방식을 따랐지만 본문을 차분히 살피고 메시지를 간추리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핵심 문제는 진정한 예배의 실종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에서 누락되거나 약화된 채 본질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쇄신해도 바깥에서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예배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지당한 말씀으로도 일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배타성을 견지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겸손한 섬김과 정직성,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의 절제 등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려낼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일상 가운데 구현되는 방식의 사례를 그러한 실천적 삶의 진정성에서 찾고자 한 듯싶었다.
설교 메시지를 집중하면서 경청하던 중, 내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한 마디가 있었다. 그는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준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대신 인터넷을 뒤지면서 웃기는 얘기 찾는 데 분요하다고 질타했다. 설교자들이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리면서 설교의 본령과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분개했다. 칼뱅을 정점으로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학문 배경이 진득하게 묻어날 정도로 L목사님의 설교기준은 뚜렷하게 개혁주의적 냄새를 풍기는 듯했다.
나는 알맹이 없는 너절한 개그로 예화를 제시한답시고 어설프게 쇼하는 설교 행태에 적잖이 식상해온 터라 그의 질타에 내심 동조하면서 그 ‘일리’를 곱씹었지만, 뒤늦게 설교에서 유머의 상관성 문제를 떠올리며 좀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설교에서 유머는 미덕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그조차 회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려는 얕은 속셈이 작동한 인기영합주의의 또 다른 변용일까. 우리말의 개념 속에 유머와 위트, 농담과 익살, 해학과 골계, 풍자와 개그 등이 개념상 선명하게 구별되기보다 부분적으로 교차되는 점이 없지 않다. 예수는 이런 말의 유희적 놀이와 무관한 엄숙주의의 옹호자였을까.
나는 내 책 <묵시의 하늘과 지혜의 땅>의 한 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의 만남을 다루면서 풍자와 해학, 골계와 익살이란 맥락에서 이 둘의 대화를 분석하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가 할례문제로 골치를 썩던 중 문제가 되는 그 남성성기의 표피가 아니라 물건 전체를 거세해버리라는 투로 발언한 순간, 나는 그의 언어에 깃든 ‘씁쓸한 농담’(bitter joke)의 기미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른바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고린도후서 11-13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적대세력을 향해 쏟아 붓는 냉소적인 빈정거림(sarcasm)의 어투가 신랄하지 않은가. 서슬 푸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근히 서늘한 위트와 함께 익살스런 수사, 반어적인 풍자와 골계가 전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영양가 없는 너절한 개그로 회중을 웃기는 것이 목표가 되는 농담이라면 인기영합주의를 의식하는 혐의에 걸린다. 그러나 특정 맥락에서 유머의 필연성이란 것도 있지 않을까. 농담의 어투가 아니라면 적절하게 전달하기 힘든 메시지란 것도 있지 않을까. 설교가 복합적인 예술의 장르라면 이러한 다채로운 창의적 수사를 엄숙한 개혁주의 규범 속에 저당잡아둔 채 예술적인 영감을 선사할 수 있을까.
유학시절 시카고대학교 종교사학파의 현재를 진두지휘하는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 교수와 캠퍼스에서 종종 부대낀 적이 있었다. 세미나실에서도 그의 풍모는 가히 희비극적인 씨닉의 자태 그 자체였다. 벽화속의 이집트 여인 같은 헤어스타일에 중절모자를 눌러 쓴 그는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연극배우의 표정으로 대개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논쟁이라도 붙을 양이면 목청을 높이면서 모노드라마 하듯 자신의 주장에 대한 쟁쟁한 변론을 쏟아냈다.
한번은 점잖은 신학자와 한 판 붙었는데, 그는 스미스 교수의 빈정거리는 어투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Joke is not an argument’라고 일격을 가했다. 그 순간, 스미스 교수는 발끈하면서 책상을 두 손으로 탁 내려치더니 뇌성벽력 같은 목소리로 ‘To me joke is the only argument’라고 받아쳤다. 상대방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면서 고밀도의 농담이 진한 위트와 풍자로 충전되어 좌중에 흐르던 날카로운 긴장을 와르르 무장 해제시켰음은 물론이다.
내 상상력이 작동하는 한 예수가 늘 엄숙주의의 표정으로 설교했을 것 같지 않다. 복음서 저자들의 편집 의도는 예수의 비애와 울음을 최대한 증폭시키면서 그 뒤에 희열과 웃음의 순간을 최소치로 응결시키거나 숨겨버리는 것이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편집적 은폐와 축소의 커튼마저도 예수의 질펀한 삶의 현장을 아주 감출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예수보다 한층 더 엄숙주의의 휘장으로 두른 바울 역시 제 진지한 삶의 운명을 달래줄 몇 마디의 유머와 농담은 필요했을 것이다. 공중집회의 질서를 중시한 그 역시 개혁주의의 교리나 그 신학적 매뉴얼에 충실한 설교를 했을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더러 유머와 농담만으로 짜인 설교를 꿈꾸어보는 것이 엄숙주의 설교의 경직됨을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터넷 서핑하며 우스갯거리 소재를 찾아 너절한 개그로 인기영합주의를 꿈꾸는 설교자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청중이 듣고 새기기에 따라 그 자체로 이 시대의 삶을 반어적으로 대변하는 예언자적 징후일 수는 없을까. 정반대로 견디기 힘든 삶과 구원의 무거움을 고스란히 카피하는 설교자의 시종일관 근엄한 표정과 엄중한 어조, 심각한 메시지는 얼마나 코믹한 연극무대를 연상시켜주는가.
설교에서의 유머에 관한 한, 우리는 그 유머의 수사학적 의도를 넘어 오늘날 교회가 연출해놓은 무대장치로서의 강대상과 극장식 연기술로서의 설교 장르의 뿌리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의 이야기와 바울의 선교 메시지 속에 그런 프로그램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저들의 원초적 경건은 근대적 대중 집회 공간의 웃기고 울리는 쇼맨십과 전혀 무관했듯이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적 엄숙주의 내지 도덕주의 가운데서도 자생적 인연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