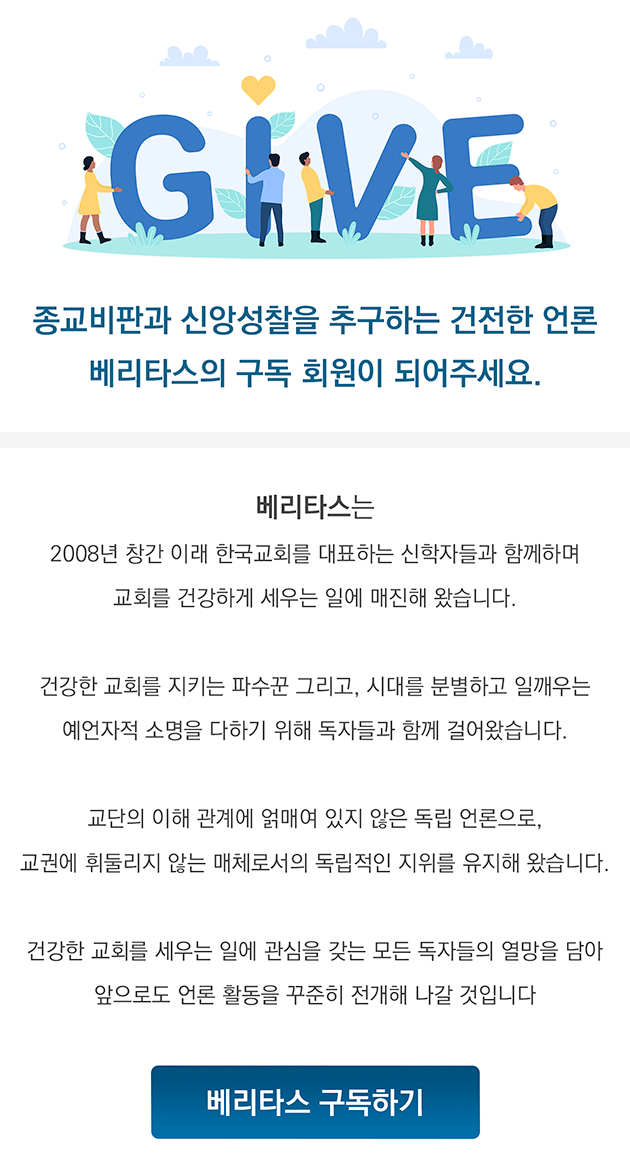출처 : 차정식의 신약성서여행 <바로가기 클릭>
글쓰기를 논할 만한 자질을 갖추진 못했지만 몇 마디 해본다. 글과 관련해서 내가 자주 듣는 얘기. 글은 무조건 쉽게 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너스 메뉴. 진리는 단순한 거다. 나는 이 말들을 덕담 차원에서 반쯤만 챙긴다. 이런 말이 습관처럼 툭툭 내뱉어지는 배후엔 ‘문체’에 대한 고뇌와 사려 깊은 숙성이 없다. 이와 함께 쉬운 글쓰기 주장의 또 다른 전제는 글/언어의 궁극적인, 유일한 의미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란 것.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문재로 시인 황지우가 상찬한 문학비평가 고 김현 선생. 그가 김정환 시인의 작품 한 편을 분석하면서 난해함과 모호함의 필연성을 논한 적이 있다. 핵심 논점인즉 이렇다. 난해함을 위한 난해함은 분명 악덕이다. 그렇지만 뒤틀린 생...의 층층면면을 드러내기 위해 글의 리듬이 꼬이고 난해하게 늘어지는 속내의 필연성이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거기에서 행간의 의미에 대한 독자의 심사숙고와 함께 해석의 풍요로움이 우러난다.
나는 운문뿐 아니라 산문에도 감칠맛 나는 리듬이 있다는 걸 미당 서정주 전집을 읽으면서 깨쳤다. 이 맛을 알고 나서, 리듬이 없는 글은 참 읽어주기 어려워졌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쓴 신문잡지 기사 등속의 글이 아니라면, 제대로 숙성한 글에는 행간의 여운과 함께 ‘일회적인 것의 아득한 나타남’이라는 ‘아우라’(aura)가 풍겨난다. 신문기사도 풍성한 어휘로 농익은 문체와 리듬을 살려 제대로 쓴 걸 읽으면 쫀득거리는 찰기가 느껴진다. 남근주의자 김훈이 그토록 욕을 먹으면서도 제 글로써 한소리 하는 배경에는 그만의 독특한 문체의 힘이 있다. 나는 물론 그의 탐미주의적 근성을 반쯤만 좋아한다.
자꾸 되짚어가며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글은 그 내용의 메시지뿐 아니라 형식이 주는 메시지를 담은 종류의 글이다. 거기에는 모범적인 정갈한 간결체와 늘어지며 길게 호흡하는 만연의 흐름이 두루 담겨 있다. 그 흐름은 더러 계면조와 중모리, 중종모리의 꼬들꼬들한 리듬이 굽이치면서 한 줌의 메시지를 풍성한 비의적 상상력 속에 담아준다. 내가 최상급으로 치는 글의 리듬은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반복하면서 더러 길항하고, 길항하면서 조화를 꿈꾸는 아찔한 긴장의 틈새를 만들어내는 종류이다.
물론 글쓰기에 단 하나의 모범은 없다. 나는 웬만한 모범은 두루 경멸하고 남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글들의 풍경에 쉽게 식상해한다. 논문 쓰기도 종합정리 식으로 도배하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나 누구라도 비슷하게 할 만한 내용을 억지춘향의 인습 속에 갈겨버릴 때 거의 구토증상을 느낀다. 글로써 대중의 호감을 견인하는 공감의 미덕을 존중하지만 스타일은 공감 없이 고독 속에 자족할 줄 아는 또 다른 덕성을 갖추고 있다. 소통의 인스턴트 시대에 소통 이후의 후유증을 고민하는 자라면, 또 소통의 형식이 그 내용의 풍성한 질을 담보하는 측면을 배려할 줄 안다면, 문체 없이 글 쓰는 것이 왜 고역 중의 고역인지 알아차릴 것이다. 무늬 없는 생이 어찌 인문의 생이랴... 싶은 것이다.
글쓰기가 난해하다고, 모호하다고 타박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존재에 스민 난해함과 모호함과 복잡성에 눈떠보라. 문체가 어지럽고 현란하다고, 현학적이라고 꼬집기에 앞서, 제 실존의 무늬에 얼마나 복잡한 욕망의 풍경이 어룽지는지 상상해보라. 그러고 나서 글의 행간에 혹여 내가 놓치고 사는 버려진 아름다움이 없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난해한 고행의 성찰을 통과한 연후에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투사되는지 살필 일이다. 그것이 독서의 진도가 더딘 글을 성급하게 내동댕이치거나, 제 글을 못나게 학대함으로써 생의 고민을 현 단계에서 눙치며 덮어두는 것보다 좀더 나은 진보적 선택이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