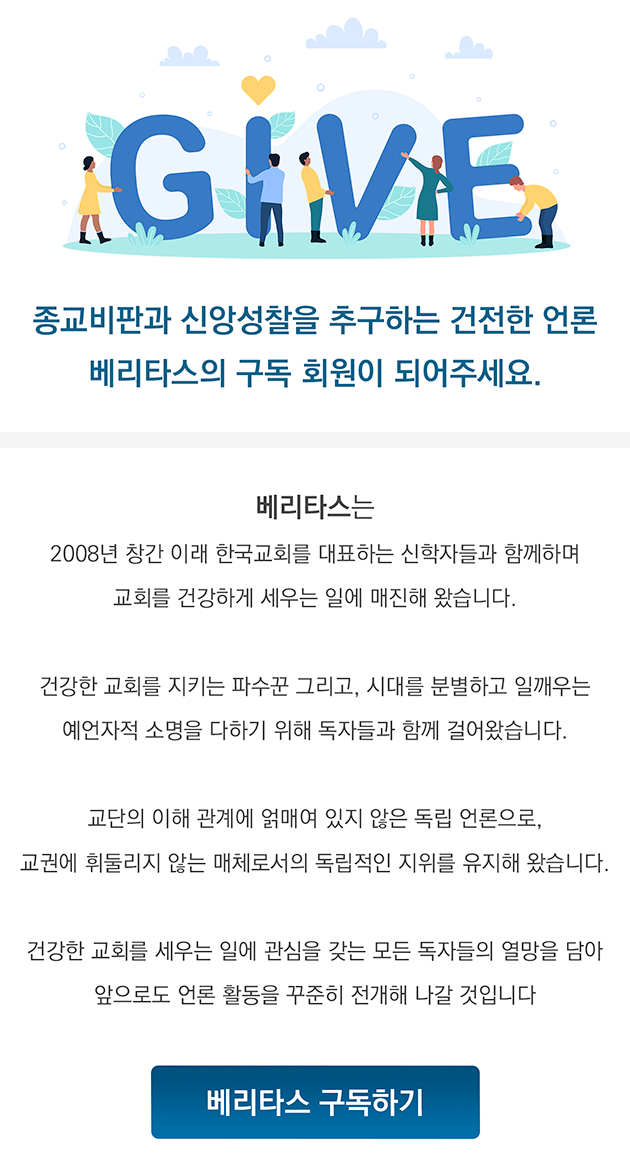출처 : 차정식의 신약성서여행 <바로가기 클릭>
콩나물국밥 한 그릇의 희멀건 후광으로
오래된 전통처럼 새 아침이 열린다
편두통의 새벽에 몸 뒤채다가
뒤숭숭한 꿈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다시 먼지 폴싹이며 시내버스가 떠나곤 했다
정류장에는 인습의 꼬리에 붙들린 무표정한 군상들
6월의 가로수는 축축한 잎새를 털며 하품을 한다
건널목 건너 자연옥에 앉으면 탕탕탕 마늘 한 개
으깨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없이 제공되고
나는 조간신문의 기사와 국밥의 맛을 번갈아 다시며
간밤의 망각을 헤집는다
분쟁과 파업과 사고와 위기가 둥둥 국물처럼 눈앞에 떠다니고
페루의 티티카카호에 낀 녹조와 마추피추의 아득한 절벽이
그리움에 묻혀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세상살이는 본디 이다지도 잡탕인 것!
땀 닦고 문을 열면 대로 따라 길게 아침기운이 미끄러져
천변 쪽으로 스멀거린다
하루의 시작은 콩나물국밥의 자연과 박하사탕의 인공 사이로
뒤섞이어 터벅터벅 낙타의 발굽처럼
도심의 사막 속으로 침전한다
이 땅에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대가로
하루의 노동이 잠시 숨을 고르는 날,
갈라진 혀와 문자의 행간에는
침묵의 망토에 가려진 총소리 여전히 난무한다
더이상 비명에 놀라지 않는 우리들,
상처가 이미 버릇이기에 내성의 방어막에 축소된
이시대의 측은한 심장들
콩나물국밥 투가리 안으로 간밤의 아우성이
쥐어짠 생기의 안간힘을 담아낸다
그 잔여의 관성이 내 발걸음을 밀어내고
서서이 기지개 켜는 기계음 속으로
또 하루의 일상이 열리고 있다
그 수수로운 길모퉁이에 서성이는 섭리여,
그대의 광맥은 어디로 뻗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