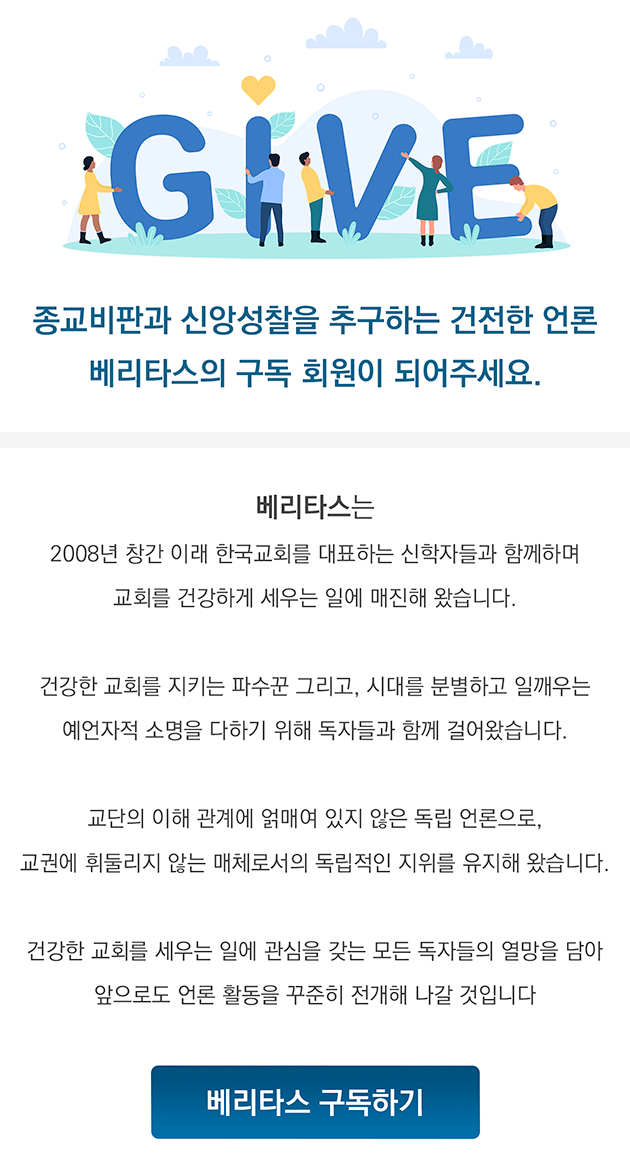출처 : 차정식의 신약성서여행 <바로가기 클릭>
안식학기를 받아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에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첫 서너 달 동안은 책을 집필하는 작업에 골몰했다.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새벽부터 자정 넘도록 꼼짝하지 않고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글을 썼다. 어깨가 자주 뻐근해졌고,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이 흘렀다. 그 단조로운 시간의 리듬을 깨면서 한 시간마다 내 의식을 명랑하게 뒤집어준 것은 신학교 시계탑에서 들리는 종소리였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김없이 정각에 느린 단선율로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는 내 귀에 점점 더 강하고 크게, 청아한 빛을 더하며 꽂히곤 했다. 책을 짓는 내 노동의 강도에 비례하여 그 종소리가 주는 안온한 위안의 힘도 커졌다. 또 혼자 온종일 집중하여 작업하는 고독의 심도에 비례하여 그 소리의 울림 속에 퍼지는 신비감도 강렬해졌다.
신학교의 느린 시계탑 종소리가 집중된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후련한 자기 해체의 평안을 선사한다면, 신학교 부부기숙사 바로 옆에 위치한 정교회의 종소리는 탱탱한 삶의 도약을 예비해주는 분위기로 나를 압도한다. 러시아 출신의 정교회 신부는 주일아침과 토요일 저녁 예배시간 전에 나란히 연결된 크고 작은 종들을 치는데 거기에는 판소리의 중중모리 가락을 닮은 정교회 특유의 리듬이 있다. 요즈음에는 자신의 영성을 다듬으려는 심사인지 매일 저녁 몸을 흔들면서 신명을 다해 종을 친다. 귀에 이어폰까지 낀 폼이 제가 치는 소리로써 제 삶의 결을 다듬으려는 의지가 설핏 엿보인다. 다소 요란한 듯 들리는 이 종소리는 푹 가라앉은 기계적인 일상에 때로 날카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쟁쟁거리는 소리는 위협적이지 않다. 거기엔 세파에 지친 어깨들을 토닥거려주거나 게으르게 처진 영혼들의 태만한 정조를 고양시켜주는 힘이 느껴진다.
종소리는 제 몸을 때려 소리를 낸다. 종소리는 제 몸을 제물삼아 허공에 제사를 지내는 순전한 헌신의 표상이다. 종소리의 신학적 미학은 처녀 심청을 사공들이 공양미를 주고 사서 제물로 바치는 옛이야기의 구도를 뒤집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사제와 제물이 따로 놀면서 겉도는 이 땅의 종교적 풍토 속에 제 몸을 제물 삼아 제사를 지내는 이 종소리의 헌신은 갸륵한 전복의 메시지를 던진다. 서로를 밥으로 삼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쉼 없이 미끼와 덫을 놓는 이 무한경쟁의 세속사회가 우리 앞에 던진 도가니의 현실은 또 어떤가. 그 구차한 생존의 현실 앞에서 종소리는 제 몸을 때리며 ‘이제 그만 되었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책을 짓는 작업이 마침내 일단락되고 이런저런 일상의 잡사에 휘둘리면서 종소리는 한동안 내 귀에 뜸하게 들리다가 실종되곤 했다. 이 지역의 뽀송뽀송한 햇살에 심취하여 산과 계곡을 헤집고 다니면서 내 고독의 반려자는 종소리에서 새소리, 바람소리로 변해갔다. 그러다 가을날 낙엽이 구르는 주변의 초등학교 교정을 거닐 때면 그 낙엽소리를 깊이 들으며 흙으로 돌아갈 내 미래의 몸을 미리 추억해보았다. 나이 들어갈수록 낙엽 구르는 소리의 아름다움이 의식의 저변에 사무치게 와 닿는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 우기를 맞으면서 나는 며칠째 고독의 한 가운데서 빗소리를 듣는다. 빗물이 우박 떨어지는 소리처럼 굉음을 내며 내 밤의 둔중한 의식을 두드릴 때면 나는 이 세상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 이방의 빗소리는 힘이 세다. 여린 마음은 그 소리를 숨 죽이며 듣는다. 빗물이 합세하여 길가의 도랑을 만들며 흘러가는 소리까지 듣는다. 그 물들의 질주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이상하게 내 영혼의 심연에 퍼지는 평안은 더없이 아늑해진다. 아마도 물이 주는 정화의 연상효과와 우뢰와 같은 그 청각 이미지로 말미암은 종말 심판 이후의 고요한 분위기가 도드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소리는 언어와 다르다. 정형화된 언어가 못되지만 어떤 소리는 때로 언어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의 고독을 질료 삼아 파고드는 신적인 계시의 예봉 같다. 베드로가 숱하게 닭소리를 들었을 텐데, 스승 예수가 체포되고 찾은 가야바의 뒤뜰에서 새벽녘 들은 닭소리는 그의 운명을 예고하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히지 않았던가. 그 소리는 망각 속에 묻어둔 예수의 예언을 아프게 되살려내고,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제 인간적 비겁함을 일깨우며 한없는 통곡 속에 그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던가. 고독한 새벽 미명에 울려 퍼지던 소리는 그처럼 깊고 강렬했다.
이제 내 고독의 내면도 파장하고 짐을 쌀 때가 되었다. 저 친근해진 이방의 종소리와 바람소리, 새소리와 빗소리와 작별할 때가 되었다. 내가 홀로 머물 때 은근히 다가와 내 기도가 되어주었던 소리들...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모른 채 한없이 가라앉을 때 아무 말 없이 제 몸을 때려 제사지내는 법을 일깨워준 저 천연의 소리들. 가장 황폐한 고독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준 즐거운 사물들. 가장 심각하고 컴컴한 실존의 어둠을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유머를 잊지 않도록 도와준 고마운 타자들. 이제 이별과 함께 내 삶의 일부로 추억이 될 시점이 가까워온다.
잘 있거라. 내가 아닌 것들로 내가 된 것들아! 내 속에 둥지 틀어 동거한 낯선 소리들아, 저 무연한 허공을 헤치고 찾아와 친근함을 선사한 하나님의 벗들아!